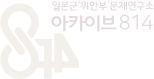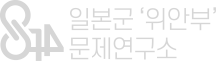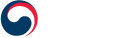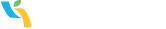컬렉션
무라야마 담화, 평화와 신뢰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관련있는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 국가들과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국의 깊은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 우호 교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무라야마 담화 발표중 -
김학순님이 생전에 국민기금 반대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평화와 신뢰
무라아마 담화는 1990년대 탈냉전 시기의 국제 정세 변화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필요에 따라
평화
라는 키워드와 함께 나오게 되었다. 담화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의지하는 데는 신뢰보다 더한 것이 없다
고 말하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반성과 함께 역사 연구와 외교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하였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이후 내각도 모두 이러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수정,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역사 부정 발언, 일본 평화 헌법 9조
1
개정 등의 모순적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이 여러 차례 사죄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계승하더라도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역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이다.
아시아여성기금과 도의적 책임
1996년 6월 부전결의 의결 이후, 무라야마 내각은 7월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이하 아시아여성기금)〉
2
을 발족하였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보상 사업과 여성의 명예와 존엄 등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 내용
3
은 아래와 같다.
- 1‘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국민 모금
- 2의료, 복지 등에 정부 자금 지원
- 3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 4‘위안부’ 관련한 역사 자료 정리하여 역사 교훈으로 삼기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도의적 책임
을 진다는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존엄과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수준에 그쳤고, 이에 한국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 더 나아가 전쟁 범죄와
법적 책임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며 민간에 의한 ‘위로금’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