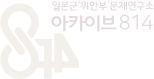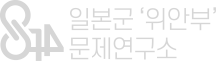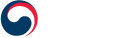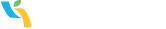컬렉션
포로 그리고 귀환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위안부’ 이야기〉, p.62 박영심의 이동 경로
-
동원 / 이동
-
'위안부'
-
포로 / 귀환
포로 그리고 귀환
많은 '위안부'들이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 사이에서 죽었고, 살아남은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함께 포로 수용소로 보내져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만 했다.
1945년 5월 미중 연합군의 공격으로 연합군이 다시 버마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상황 속에서 일본군과 함께 있던 '위안부'들은 3가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본군과 함께 죽거나 전장에 홀로 남겨지거나 아니면 일본군과 함께 도망가는 선택지밖에 없었다.실제로 많은 위안부들이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 사이에서 죽었고, 살아남은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함께 포로 수용소로 보내져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만 했다. 게다가 버마로 이송된 위안부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귀환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① 버마는 한반도와 너무 떨어져 있었고, ② 현지 주민과 언어도 통하지 않았으며 ③ 일본군이 발행한 도항 증명서가 없으면 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1946년 초부터 동남아시아 연합군이 일본인 포로들과 함께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조선인들은 연합군이 제공한 큰 배를 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일본 혹은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버마 '위안부' 박영심
1921년 12월 15일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태어난 박영심은 ‘처녀 공출’에 걸려 나이 18세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평양으로 압송되었다.

1921년 12월 15일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태어난 박영심은 ‘처녀 공출’에 걸려 나이 18세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평양으로 압송되었다. 평양에서 기차와 자동차를 타고 처음 끌려간 곳은 중국 남경이었다. 이후 중국 남경에서 싱가폴을 거쳐 버마 랑군으로, 버마 랑군에서 라시오, 중국 윈난성의 송산으로 이동하며 '위안부'의 삶을 겪고 이후 연합군에 의해 발견되었다.
특히 1944년 9월 그녀가 송산 위안소에 있을 당시 중국군의 반격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중에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전투 지역을 가까스로 탈출하였고, 이후 중국인 농부에게 발견되어 곤명의 포로수용소로 이동하여 일본군과 함께 포로 생활 을 하였다. 약 7~8개월의 포로 생활 이후 중경을 거쳐 조선으로 귀환한 후 그녀의 고향인 평안남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